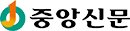| 중앙신문=중앙신문 | 택배 편으로 감 한 상자가 배달되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손아래 동서가 보낸 감입니다. 상자에는 흙이 덕지덕지 묻었습니다. 허접스러운 끈으로 묶은 모양새 또한 촌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솔직히 꺼내 먹고 싶은 마음이 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얼굴빛이 뚱해집니다. 그런 나를 흘깃 쳐다보던 아내가 동여맨 상자 끈을 풀면서 중얼거립니다.
“아이고 저 양반, 까다로운 성정머리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네.”
사십 년 가까이 한솥밥 먹다 보니 낯빛만 봐도 속내를 다 읽는 아내입니다.
풀어놓은 상자 속에는 잘 익은 동이 감이 가득 담겼습니다. 양 볼이 빨갛게 물이 들었습니다. 어릴 적 뒷모습만 봐도 가슴 쿵쾅거리던 고향 동네 뒷집 순이 볼을 닮았습니다. 촌티 줄줄 흐르는 겉모습과는 완연하게 다릅니다.
사람 마음 참으로 간사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땟국이 흐른다고 홀대했던 감이지만 눈앞의 홍시를 보니 금세 입에 침이 고입니다. 아내가 인물 좋은 놈 하나를 골라 건네줍니다. 한입 베어 물어보니 이루 말할 수 없이 달콤합니다.
갑자기 사십 년 전에 영면하신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한겨울 장독 깊숙하게 묻어둔 홍시를 꺼내어 입안에 넣어주던 어머니. 그 선한 눈빛이 감 상자 위에 일렁거립니다.
나에게는 고치기 어려운 벽(癖)이 하나 있습니다. 귀가 순해진다는 이순(耳順) 문턱을 넘어선 지 한참 지난 나이인데도 허우대만 멀쑥하면 속까지 꽉 찬 줄만 아는 덜 여문 버릇입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잘 익은 동이 감을 후줄근한 상자에 담았다고 낯빛까지 변하는 못난이입니다. 그나마 은퇴 후 수필 교실 문턱을 넘은 뒤부터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성악 교실 피아노 소리를 들은 후로는 한결 덜합니다. 그러나 아직 멀었습니다.
오늘도 초겨울 햇볕이 내리쬐는 창가에 앉아서 원고지와 씨름을 합니다. 끙끙 가슴앓이하면서 끼적거려봅니다.
“뭘 그렇게 어렵게 사시느냐?”
아내의 타박 소리는 여전합니다.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자꾸만 그러고 싶은 것을.
아내가 홍시 반쪽을 떼어 입속으로 넣고 있습니다. 아내 입가에 ‘홍시 표 립스틱’이 묻었습니다. 성(姓)이 홍 씨라서 그런지 유난히 홍시를 좋아하는 아내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내 대답이 못마땅한지 반쪽만 먹다가 내려놓습니다.